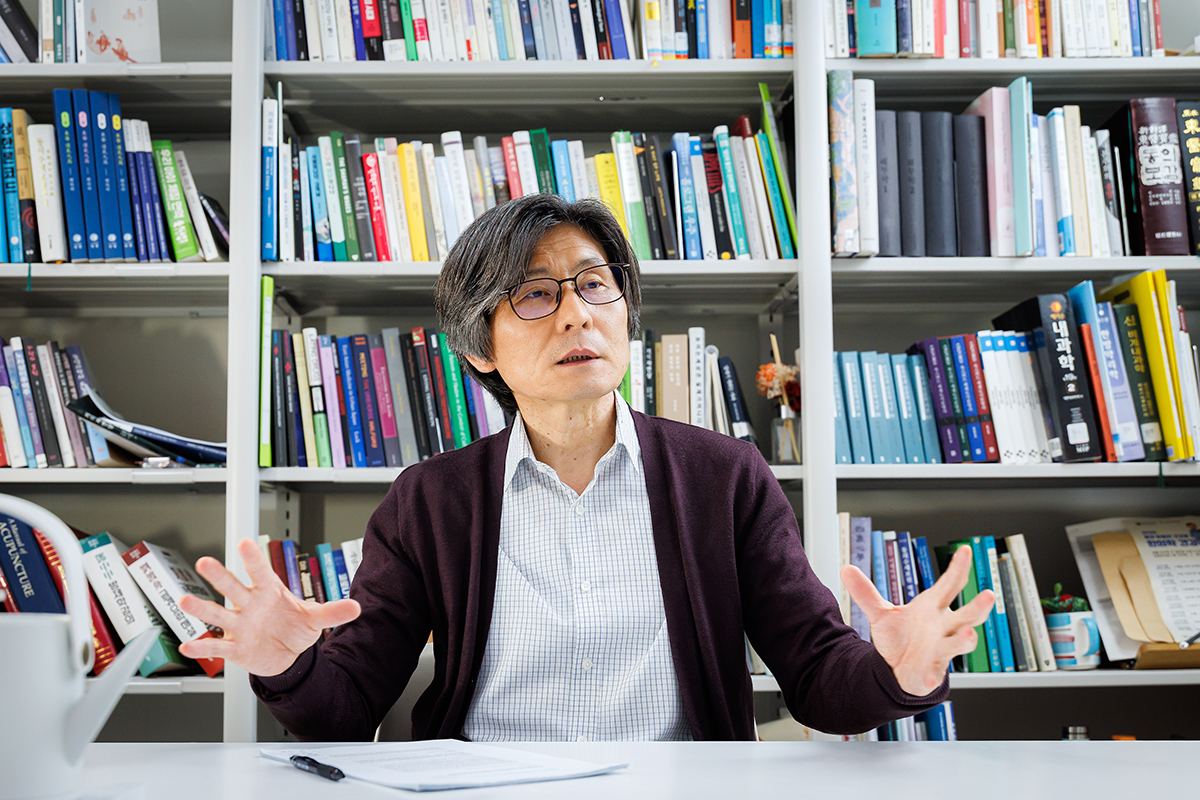아날로지즘으로 이해하는 ‘마음침’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 연구 성과, 국제 학술지에 게재
인류학자로서 사암침법학회 대상 현장 연구로 연구 성과 도출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는 인류학자다. 미국에서 수학하던 2007년 박사 논문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잡고 3년간 연구를 진행했고, 2013년부터 한의과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고유 사유 방식인 ‘아날로지즘(Analogism)’을 기반으로 새로운 침 치료 실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성과는 「Ontology and Acupunctur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제 학술지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에 게재됐다. 그를 만나 연구 결과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Q. 연구 결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인류학자로서 현장 연구를 한다. 2007년부터 한의학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사암침(舍岩鍼)’을 연구했다. 이 사암침에는 ‘마음침(Mind Acupuncture)’이라는 침 치료가 있는데, 최근에 큰 관심을 받는 주제다. 사암침법학회는 워크숍, 세미나,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쌓고 있고, 인류학적 현장 연구를 통해 마음침을 분석했다.
중요 논점은 마음침에 내재된 ‘존재론적 전제’다. 논문에서 가장 특징적 지점이다. 사암침은 ‘원위취혈(遠位取穴)’의 방식을 쓴다. 통증이나 질환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혈에 침을 놓는 방식이다. 통증과 연관된 다른 부위에 침을 놓는데, 마음침도 동일하다. 이런 방식은 몸과 마음을 별개로 두면 이해할 수 없다. 동아시아 의학은 몸과 마음이 연결됐다고 이해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아시아 존재론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다.
마음과 신체 연결됐다는 동아시아적 존재론 기반 해석
Q. 마음침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원에는 통증 환자가 많다. 통증은 심리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사암침법학회가 일찍이 관심 가져온 주제다. 사회적 변화도 관련 있다. IMF 이후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 이야기가 일상화됐다. 사암침법학회는 마음의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침 치료를 고민했다. 결국 사회적 현상을 통해 새로운 침법에 관한 관심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한의학은 전통 의학이라 옛 지식의 전승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 있다. 전통의 철학과 이론에서 출발해 새로운 해법을 도출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존재론, 몸과 마음을 연결된 것으로 보는 철학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류학에서 ‘존재론적 인류학’이 대두되고 있다. 각 문화가 가진 존재론적 바탕을 탐구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이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필리프 데스콜라(Philippe Descola)는 ‘자연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만물이 상호 연관됐다는 동아시아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아날로지즘’이라고 명명했다.
아날로지즘의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마음침 치료가 진행되는지 분석하려 했다. 한의학이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보는 철학이 어떤 존재론적 기반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 건강의 문제를 통합하는 부분이 연구 지점이다.
Q. 현장 연구에서 목격한 아날로지즘은 무엇인지, 환자의 감정과 신체 연결 과정이 궁금하다.
흥미로운 부분이다. 정신적 문제는 환자가 겪은 사건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발생한다. 마음침 치료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의 마음을 온도, 색, 촉감 등의 오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물렁물렁하다, 거칠다 등의 방식인데, 한의사는 이를 음양이나 오행, 육기 등으로 분류해 치료한다. 치료 중에도 맥을 자주 보며 치료법을 교정하는 식이다.
마음침을 시행하는 한의사 단체의 경북 산불 봉사활동에 동행했다. 이재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트라우마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나 이명이 생긴 환자들이 있었다.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마음침 치료를 적용했고, 증상이 호전됐다. 산불 이후에 이명이 심해져서 큰 목소리로 말하는 할머니가 트라우마에 대한 침 치료 이후 이명이 줄어들면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렇듯 침이 심리적 부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존재 간의 구분 중시하는 사상에서 벗어나 모두 연결됐다는 동아시아적 사고로의 전환
Q. 연구에서 ‘존재론적 전회’를 이야기했다. 이런 연구가 한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몸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은 하나였다.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몸이다. 존재론적 인류학의 대두로 지역마다 몸에 대한 이해가 다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의학에서도 한의학이 이해하는 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지 노력했다. 서양의과학의 체계였다. 그런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풍부한 성과를 냈다. ‘존재론적 전회’를 통해 한의학이 원래 갖고 있던 동아시아의 몸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점이 한의학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인류학적 연구 속에서 동아시아적 존재론이 갖는 의미와 현대문명이 동아시아적 존재론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다양한 지구적 난제가 존재론과 연결된다. 그동안 인류는 자연을 자원으로 생각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여겼다. 인류문명이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기후위기다. 인류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간이 그 외의 존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존재론과 연관된다. 존재론적 전회도 이런 부분을 이유로 동아시아적 존재론에 집중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에 기후-몸연구소를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몸이 기후다』라는 책도 썼다.(책 소개 바로가기)
Q. 인류학자로 한의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처음에는 조금 단순한 이유였다.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거쳤다. 인류학자들은 의학 관련 연구를 많이 한다. 아주 작은 인구 단위까지 선행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의학도 연구한 연구자가 있다. 그렇게 많은데 한의학과 관련해서 영어로 된 박사 논문이 없었다. 막상 연구를 시작하니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선행 연구가 없으니 더 노력해야 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현장 연구가 3년이 걸렸다. 그렇게 진행한 한의학 연구를 인연으로 경희대 한의대에 자리 잡게 되었다.
Q. 향후 목표가 궁금하다.
존재론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연구가 많다. 새로운 침 치료, 한의학적 진료 등을 존재론과 연결해 해석하려 한다. 그리고 한의학 외에도 기후 문제나 인류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해석할 수도 있다. 다양한 존재론의 배경에서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면 다른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이야기되는 존재론적 인류학이 단지 인류학만이 아니라 신유물론이나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은 인문사회과학과 연결된다. 이런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글 정민재 ddubi17@khu.ac.kr
사진 이춘한 choons@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